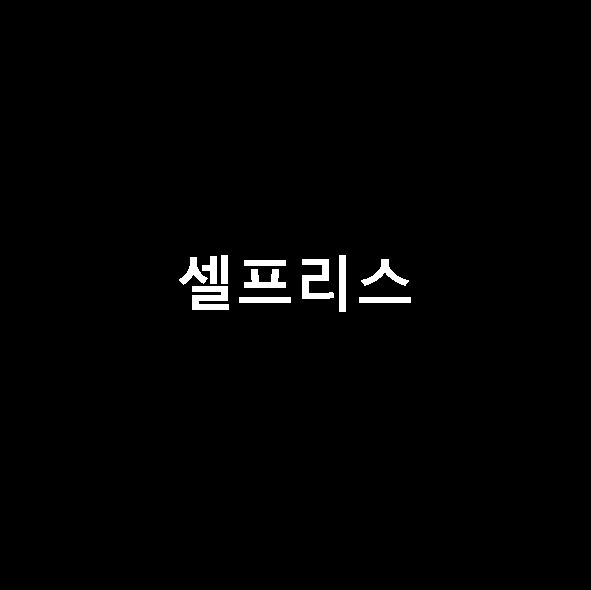셀프리스, 삶을 갈아입은 남자
- 관리자

- 7월 31일
- 1분 분량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살아 있다는 감각은 단순히 심장이 뛴다는 뜻일까...?
아니면,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는 뜻일까
나는 처음 이 영화를 접했을 때 SF보다 인간 드라마에 가깝다고 느꼈다. 기술은 도구였고, 진짜 중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에 있었다.
낯선 몸에 익숙한 생각이 산다는 것
주인공은 성공한 사업가다. 명성, 부, 권력 그가 쌓아온 인생은 누구보다 단단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처음엔 모든 것이 이상적이었다.
젊은 몸, 새로운 감각, 살아 있다는 만족감까지
이 영화의 매력은 바로 이 균열에서 시작된다. 새로운 삶이 주어진 게 아니라 남의 삶 위에 올라선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주요 캐릭터, 복잡하게 얽힌 감정의 조각
데미언: 신체는 젊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기억은 완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다. 점점 불편해지는 감정들 속에서 그는 단순한 생존보다 존재의 의미를 고민하게 된다.
전신의 가족: 데미언이 입은 육체는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 몸엔 누군가의 삶, 사랑, 책임감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이 영화는 '죽음'이 아니라 '삶'을 말한다
<셀프리스>는 죽음이라는 종착점을 미루는 데 성공했지만 정작 삶의 본질은 그 과정에서 더 명확해진다.
내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울 때 결국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 영화는 그 질문에 대해 크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생각할 여지를 남긴다.
기술이 인간을 살게 만들 수는 있지만,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들 수는 없다.
그건 오직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기억되고, 이해 받고, 사랑 받는 순간에서 말이다.